
*위 사진 : 우리나라에서처럼 구두를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고 법원 복도에서 바로 구두를 닦아주었다.
법원은 기다리는 게 일이라더니
회사일 때문에 찾아간 멕시코의 멕시칼리에 있는 연방고등법원에서도 그랬다.
같이 간 회사 직원과 하릴없는 사람처럼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출입허가증을 가슴에 찬 구두닦이가 들어왔다. 직원은 좋은 소일거리를
만난 양 그를 불러 세워 구두를 내밀었다.
그러고는 나보고도 하란다.
*위 사진 : 아내는 내가 이렇게 빛나는 구두를 신은 것을 결혼식 이후로는 본적이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지루하던 차에 구두통 위에 신발을 올려놓았다.
좀처럼 구두를 닦지 않는 나로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해야겠다.
잠깐동안에 구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설빔으로 새 운동화를 얻어 신은 아이처럼 발꿈치를 들어가며
빛나는 구두의 요모조모를 살펴보다가
문득 삼십년 전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사회에서 구두닦이를 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없었다.
선임병은 질문을 바꾸었다.
“그러면 구두 닦는 것에 관심이 있거나 배워보고 싶은 사람.”
나는 손을 들었다.
나 이외에 한두 명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았다.
“(사회에서) 뭐 하다가 왔어?”
‘딱쇠’ 선발 인터뷰(?) 치고는 꽤 까다로운 질문을 거쳐 내가 선발 되었다.
이유는 한 가지였다.
내가 대학교에 다니다 입대했으므로
'먹고대학생'은 미팅에 나갈려면 멋깨나 부렸을 것이라는
선임병의 근거없는 추측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대학생활 내내 나는 구두라고는 거의 신어보지 않았다.
나는 철저히 운동화만을 신고 다녔다. 어쩌다 일 년에 한두 번 구두를 신은
날은 ‘구두 멀미’를 할 지경이라고 친구들에게 익살을 부리곤 했다.
멀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나는 구두를 싫어했다.
운동화에 비해 높은 뒤축과 딱딱한 질감이 늘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딱쇠가 되고자 손을 든 것은 기왕에 군대에 왔으니 안해 본 일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후임을 뽑으러 온 그 선임병이 진짜 딱쇠 출신이라는
소문도 나의 호기심을 사로잡았다.
당시 우리는 논산훈련소를 막 퇴소하고 후반기 교육을 받기 위해 부산에 와있던
상황이었다. 아침에 간단한 일조점호가 끝나면 밥 먹고 교육을 받으러 가기 전까지
각자 할 일을 분담하였던 것인데, 딱쇠라는 보직(?)은 내무반장과 일직사관,
대대장 등의 군화를 닦아 놓는 일이었다.
다른 보직으로는 위 사람들의 군복을 빨고 다려놓는 ‘정비사’에서부터
교장실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밥을 타다 주어야 하는 ‘고양이 딱가리’ 등도 있었다.
특별한 보직이 없는 사람들은 내무반 청소와 화단청소를 해야 했다.
딱쇠 생활 첫날부터 나는 구박덩어리가 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도대체가 구두를 닦는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쪼인트’를 몇 번인가 까진 후에 나는 나보다 일주일 늦게 입소한 새까만(?)
후배에게 딱쇠자리를 내어주고 구두를 한 곳에 모아오는 찍쇠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 선임병이 나를 끝내 내치지 않고 기술을 전수해 주려고 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고마운 일이었다. 그만이 할 수 있다는 ‘불맥끼’의 비법은 후반기 교육
3개월 동안 끝내 전수받지 못했지만 물과 구두약을 동시에 찍어 바르는 ‘물맥끼’
수준까지는 나도 흉내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고향이 대구였다고 했던가?
법원과 경찰의 높은 분들의 구두를 전담해서 닦았다고 자랑을 하던
그는, 유행가가사처럼, 지금은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가는지 모르겠다.
(2008.3)
'일상과 단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남준 시집 『적막』 (0) | 2013.06.04 |
|---|---|
| 머리 염색(곱단이의 글) (0) | 2013.06.04 |
| 장돌뱅이가 그러면 되나 (0) | 2013.06.04 |
| 이청준의 『인문주의자 무소작씨의 종생기』 (0) | 2013.06.01 |
| 성당에 나가다 (0) | 2013.06.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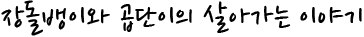






댓글